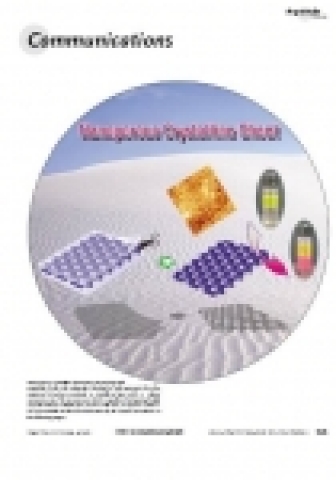[사진]벌집 모양 나노조립체로 메모리 한계 도전, 연세대 이명수 교수, 국제학회 보고
놀랍게도 단백질과 핵산은 서로 어울려 원래의 바이러스 입자가 다시 만들어진다. 물론 이들을 서로 결합시키기 위해 제3의 분자가 개입되는 것은 아니다. 단백질 분자의 구조가 특정한 형태로 스스로 뭉치게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자기조립과정이라 부른다. 결국 바이러스는 핵산 분자와 단백질 분자가 자기조립과정을 통해 결합된 초분자인 셈이다. 이처럼 바이러스의 세계에서나 볼 수 있었던 초분자를 실험실에서 만들어보겠다고 나선 과학자가 있다.
창의적연구진흥사업의 초분자나노조립체연구단을 이끌고 있는 연세대 화학과 이명수 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단백질과 핵산이 모여 바이러스라는 전혀 새로운 특성을 지닌 초분자를 만들어내듯이 교묘하게 디자인된 분자를 자기조립시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전략이다.
“화학자는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분자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분자를 만들어 이들이 어떤 식으로 초분자를 만드는지 관찰했습니다." 이 교수의 설명이다. 레고의 기본 블록의 모양에 따라 만들어지는 레고 구조물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 교수팀이 초분자나노조립체를 만들기 위해 선택한 분자의 기본 구조는 바늘 모양의 소수성, 즉 물을 싫어하는 특성을 갖는 부분과 실처럼 유연한 사슬모양의 친수성, 즉 물을 좋아하는 특성을 갖는 부분이 결합된 바늘-실 형태다. 연구자들은 바늘 부분과 실 부분의 구조를 조금씩 바꿔가며 새로운 구조의 분자를 만들어 이들이 만들어내는 초분자 나노 조립체의 특성을 연구했다.
바늘-실 분자가 모여 만들어진 초분자의 구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벌집 모양의 구조를 갖는 나노 조립체다. 세워진 바늘 부분이 서로 촘촘히 붙어 벌집의 벽을 형성하고 실 부분은 벌집 주위에서 하늘거린다. 이때 적당한 방법으로 실 부분을 제거하면 바늘 부분만으로 만들어진 나노 벌집이 얻어진다.
나노 벌집의 지름은 8㎚ 정도로 실제 벌집의 1백만분의 1도 안되는 길이다. 나노 벌집은 어디에 쓰이게 될까. “이 같은 나노 다공성 물질은 내부 표면이 소수성이므로 물에 함유돼 있는 기름 성분을 흡착해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수질정화에 폭 넓게 활용될 전망입니다." 나노 벌집은 표면적이 매우 넓으므로 소량만으로도 흡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나노 벌집을 틀로 이용해서 테라비트급 메모리 디바이스도 만들 수 있다. 기가(109)의 다음 단계인 테라(1012) 수준의 집적도를 얻으려면 메모리 단위가 매우 작아야 하는데 기존의 기술(리소그래피)로는 만들기가 어렵다. 그런데 나노 벌집 구멍에 반도체 소자를 넣으면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
이 교수팀의 연구결과는 화학분야의 최고 권위지인 ‘독일응용화학회지’ 최신호(2004년 12월호)에 속표지 논문으로 소개됐다. 이 교수는 “나노 다공성 물질은 촉매, 필터, 이온선택막 등 폭넓은 응용가능성을 갖고 있어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끄는 분야다”라며 “현재 정교한 구조를 만드는데 성공한 우리팀이 앞서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학기자협회 작성)
연세대학교 개요
올해로 창립 127주년을 맞이하는 연세대학교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에 따라 겨레와 인류 사회에 이바지할 지도자를 기르는 배움터다.
웹사이트: http://www.yonsei.ac.kr
연락처
한국과학기자협회501-3630